14.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아요.”
지난 해 제가 만났던 Kevin(가명)은 고등학교를 그만 둔 지 1년이 지난 18세의 청소년이었습니다. 당시에 Kevin의 생활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합니다. 가끔씩 오후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기 방에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컴퓨터를 만지거나 혹은 부모님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기계들을 만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기도 하지만 자기 방에서 혼자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단절된 지는 오래되었고 어머니와도 표면적인 대화만 주고 받을 뿐이었습니다. 가끔씩 친구를 만나도 그리 오래 함께 있지는 못합니다. 몇 번 직장을 다니려고 시도했다가 오래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결근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Kevin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했었고 분노했었고 그리고 상담을 할 당시에는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다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과연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민 사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보면 때때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자녀들을 방치해 놓기가 쉽습니다. 부모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린이 집과 학교와 학원과 교회와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 그리고 대중 매체와 더불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저녁에 잠시 짧은 시간 동안 피곤한 얼굴을 한 부모를 만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면 비로소 부모는 시간을 만들어서 자녀를 일방적으로 꾸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며 너를 위해서 일하는데 너는 이것 밖에 못하느냐고, 정말 실망했다고, 또 이러면 쫓아내 버리겠노라고 다그칩니다.
Kevin의 경우 이런 일반적인 이민 사회의 가정 문제와 Kevin 가정의 특수한 문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Kevin의 부모님은 다소 비판적인 분들이셨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았고 다투는 모습을 Kevin에게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어린 Kevin 앞에서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고 거친 욕설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Kevin은 ‘빨리’ 그리고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서 부모 앞에 내어 놓아야 했고, 부모가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비난과 체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는 어렸을 때의 Kevin은 언어 발달이 느리고 눈치를 살피는 아이였습니다.
초등 학교에 들어갈 무렵 미국으로 건너온 Kevin은 학교에서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그럭저럭 학교 성적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자기 표현에 미숙한 Kevin은 친구들에게서도, 선생님에게서도 인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실수에도 모든 사람이 비웃을 것 같고, 어쩌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의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런 말을 하면 비웃음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행동을 하면 싫어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 비판 받지는 않을까,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혼자서 음악을 듣는 게 좋아요. 컴퓨터로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을 하는 게 좋아요. 복잡한 기계에 몰두할 때 마음의 평안이 평안해 져요. 가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내게 3-4초간만 머물러도 마음이 철렁 내려 앉아요. 나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신경 쓰기 싫어요” 힘들게 입을 연 Kevin은 흔들리는 시선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을 가지신 분은 없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생각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슬픈 우리의 상식으로 '...증'이니 '....증세'니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 삶의 문제는 왜곡된 관계와 상처를 통해서 학습되고 굳어진 것들입니다.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다…" "정말 이상하다..." "병 인가보다..." 는 말 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굳은 상처와 아픔을 가만히 헤아려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깊고 오래된 상처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깊이 생각해보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거치면서 비로소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테니까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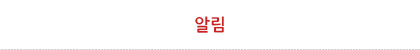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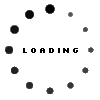
댓글 0